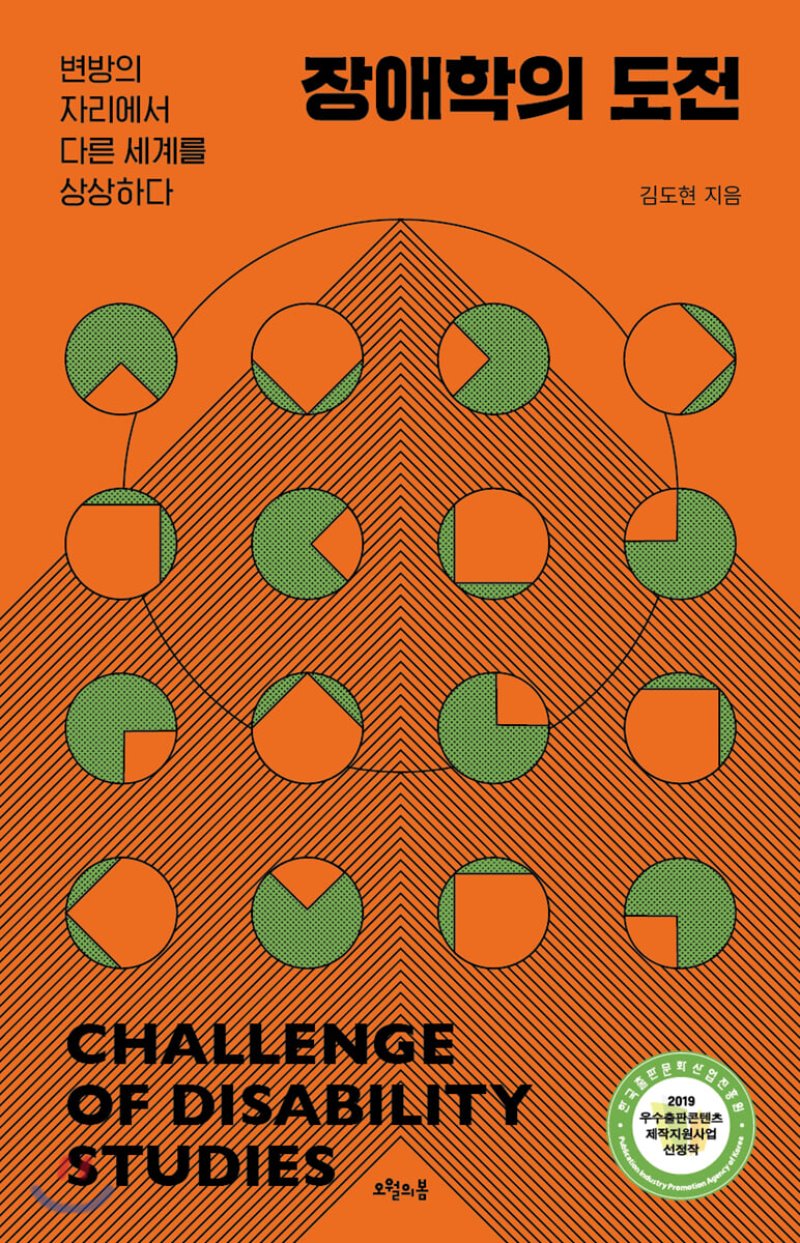
뜬금없는 자기 고백. 사실 나는 평소에 장애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딱히 더 알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 내가 <장애학의 도전>을 읽은 이유는 단순하다. 간만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마침 몇몇 페친이 이 책들에 대한 추천글을 공유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침 도서관에 갔다가 이 책을 마주쳐서 집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 생각이 참 많아졌다. 한 방 맞은 느낌이었고 세상도 꽤 다르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좀더 따끈따끈한 신간 <장애학의 도전>을 민언련 회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추천글을 써준 페친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보태는 마음으로.
손상이 아니라 차별이 장애를 만든다
<장애학의 도전>을 읽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 200년 전에는 ‘장애인’이 없었다. 물론 말 그대로 장애인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하나의 장애인 집단으로 개념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근대 자본주의에서 발명된 개념인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은 ‘임금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공통점 하나로 함께 묶였다.
이렇듯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장애인의 정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정의해야 할까?
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정의는 1980년이 되어서야 등장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의 손상으로 인해 제약과 불능이 발생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언뜻 보면 명쾌해 보이지만,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손상이 장애를 만드는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얼마 전까지 휠체어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서 사회 생활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오랜 투쟁 끝에 저상버스가 들어서면서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그렇다면 그를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저상버스 없는 사회’이다. 그래서 이 책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새롭게 정의된다. 장애인의 자립 역시 마찬가지다. 탈시설과 자립 지원이 장애인권 운동과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때로는 이 자립이 마치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자립하지 않는 ‘의존적’ 장애인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낙인을 찍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의존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의존적 존재들이다. 30대의 비장애인 부부를 한번 떠올려 보자. 이 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다. 둘 다 바빠서 반조리 식품을 자주 사 먹고 부모님 집에서 밑반찬을 얻어온다. 아내는 곧 태어날 첫째 아이는 근처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이다.
이 부부는 각종 제도와 정책, 공공기관, 의료 시스템, 가족, 시장 등에 열심히 의존한다. 어쩌면 장애인보다 더 많이 의존하는 지도 모른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은 별로 없으니까 장애인들은 의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부가 장애인보다 더 자립적으로 살아간다고 여길 것이다. 결국 자립의 핵심은 의존 여부가 아닌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립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세상이 장애인용으로 돼 있지 않으니 장애인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적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너무 의존해서가 아니라 의존할 것이 너무 없어서 자립하기가 어렵다.
장애 인권에 관심 없는 당신이 읽어야 할 책
<장애학의 도전>은 장애인권 운동의 여러 쟁점과 고민들을 깊게 다룬다. (때로는 다소 학술적인 설명도 나오지만 책을 덮을 정도로 난해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꼭 장애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읽을 책은 아니다. 내가 그랬듯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 오히려 더 추천한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영어 중에 ‘disabled people’이 있다. 주목할 부분은 ‘disabled’가 수동태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회에 의해서(by society)’가 생략되어 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적 차별, 이를 감지하지 못한 채 특권을 누리는 비장애인들이 바로 이 ‘사회’일 것이다. 장애인을 ‘disabling’하지 않고 똑바로 살려면 비장애인은 더 많이 배워야 한다.
게다가 평소에 장애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일 수록 이 책을 읽으면서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성찰할 수 있다. 기존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쾌감도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책에서 얻으려는 것, 독서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재미 아니겠는가.
- 만일 이 책을 읽고 장애인권에 관심이 생겼다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도 함께 읽어 보길 권한다.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쓴 책이라서 술술 읽히지만, 장애인의 정체성과 존엄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꽤 묵직한 책이다.
글 권박효원 작가
[날자꾸나 민언련 3월호 PDF 파일보기]
https://issuu.com/068151/docs/________2020__3_______










